한자로 풀어 읽는 도덕경 이야기
21장, 여섯 번째 이야기.
우리는 일반적으로
역사를 통해 오늘을 본다고 말한다.
우리의 일상에서도
지나 온 삶을 되돌아 봄으로써,
현재를 가늠해 보질 않던가..
그런데,
노자는
현재를 통해 과거를 본다고
이야기를 하고 있다.

노자는 뭘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?
총 6장에 걸쳐 이야기하는 도덕경 21장..
이제,
그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..
자금급고 기명불거 自古及今 其名不去
이순중부 以顺众父
오하이지중부지연야 이차
吾何以知众父之然也 以此
한 문장 씩 살펴보도록 하자.
자금급고 기명불거
自今及古 其名不去
오늘로 부터 고대에 이르기까지
그 이름은 변함이 없다.

왜 이런 의미인지 알아볼까..
일반적으로
우리들이 이야기할 때에,
역사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펴본다고 하였다..
그런데,
노자도덕경은
오늘을 통해 역사를 알 수 있다고
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.
앞서,
우리의 상상력을 넘어가고,
우리의 시야를 초과해서 존재하는
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유가
그 속에 변하지 않는
변화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.
그 규칙은
정, 도의 본질, 핵심 속에 있으며
정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,
그 실체는
우리가 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.
다시 정리하면,
우리가 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
바로
도의
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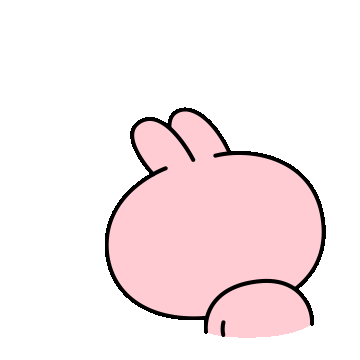
상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..
따라서,
우리가 현재에 상을 봄으로써,
(이 세상 전부터 존재해 오는)
도의 본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.
를 의미하는 것이다.
다시 말해,
금 今 은
현재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상을 의미하고,
고 古 는
원래의 도의 모습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.
그리고,
그 이름, 도는 ,
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했고,
어디도 떠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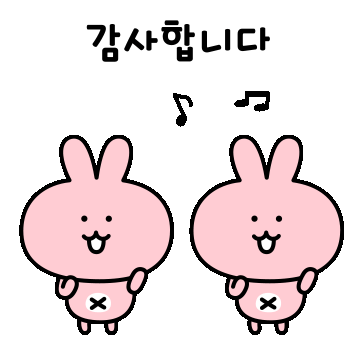
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솨함다..
두 번째 구절
이순중부 以顺众父
만물이 이를 따라 시작되었다.

이건 왜 이런 뜻이쥐.. 좀 이상한데..
여기서
주의해야 할 글자는 부 父이다.
현대 한자에서는
아버지 부 父 자로 널리 쓰이지만,
초기 부자는
땅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묘사한 글자이다..
이것이 땅에서 새 생명이 나고,
그것이 대를 이어 가게 되므로
후에 뜻이 확대되어 아버지 부가 된 것이다.
그러므로
여기서는 시작으로 해석해야 한다.

옛 ~~ 썰.. 알겠슴다.
중 众 은 많다는 의미로
중부 众父 는
만물의 시작으로 하면 적당할 것이다.
따라서 이를 합쳐보면..
만물이 이(도)를 따라 시작되었다.

아 ~~ 하..
현대의 한자로는 의미가 안 통하던데..
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..
마지막 구절
오하이지중부지연야 이차
吾何以知众父之然也 以此
내가 어떻게 이러한 만물의 시작을
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는가..
바로 이런 연유인 것이다.

어떻게 이런 해석이 될까..
마지막 구절은
앞서 설명한 것에 대한 반어이다..
내가 이러한
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은..
앞서 6장에 걸쳐 설명한
도의 성질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.
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..
도를 본다는 것은..
바로
도가 보내는 변하지 않는 규칙,
이것을..
상을 통해 보기 때문 인 것이다..

알듯도 하고, 모를 듯도 하네..
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..
우리 주변에서
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,
이미 발생한 일을
왜 발생했는지를 알 고자 한다면,
바로
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규칙, 신이 있고,
신은 그 사건의 핵심인 정을 나타내고,
정이 있음은 그 사건의 실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,
그러한 실체는
우리가 주변에 남겨진
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.
쉽게 말해
모든 것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이야기이다.
6장에 걸쳐 도덕경 21장의
하늘의 도란 무엇이고,
우리가 어떻게
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.
다음 장에서는
다시
이를 실천해야 하는
성인의 도란 무엇인가
에 대해 알아보자..

벌써 끝났어..
더 해줘.. 잉..
'인문학 > 동양고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도덕경 21장. 기중유물 - 보이지 안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. (0) | 2023.12.13 |
|---|---|
| 도덕경 1장, 도가도비상도 - 도란 변화하는 것이다. (1) | 2023.12.02 |
| 도덕경 21장. 기중유상 - 나는 니가 어제 한 일을 안다 (1) | 2023.12.02 |
| 도덕경 21장. 도지위물 - 도는 항상 우리 곁에서 있다 (1) | 2023.11.29 |
| 도덕경 21장. 공덕지용 - 도란, 덕이란 무엇인가 (0) | 2023.11.16 |



